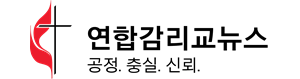프랑스 말 가운데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olerance"로 읽고 사전적인 우리말 번역은 '관용(寬容)'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똘레랑스는 관용이라는 우리말 번역과는 그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용은 보다 자기중심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다른 이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용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똘레랑스는 나도 여럿 가운데 하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저이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다르다는 의식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우리 시대를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똘레랑스라는 말을 굳이 우리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오히려 "화이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중국 고전인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는 군자를 화이부동(和而不同) 하는 사람, 소인을 동이불화(同而不和)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의 화(和)는 타인의 의견을 잘 조화하는 것이고, 동(同)은 맹목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반대로 남에게 같아지기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뭣 좀 좋은 것이 있다 싶으면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무한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떄론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 유행이나 시류를 따르지 못하면 뭔가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들과 약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소외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떤 식이든 동(同)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불화와 갈등의 씨앗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화이부동 보다는 동이불화의 성격이 더 강한 까닭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주인이며,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밖의 모든 생명체가 중심이 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찍어눌러 동화시키려는 힘을 멸하고자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는 사실로 상대방을 위해하거나 틀린 것이라고 낙인 찍는 우리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근거없는 발상에서 나온 태도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티만 지적하는 꼴입니다(마7:3). 서로가 자기 주장만 옳다 하는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화목과 조화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가득할 겁니다. 서로를 북돋아주고 살리는 힘보다 억누르고 멸하는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쟁으로 찢겨진 사회와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화이부동을 온몸으로 가르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글쓴이: 권혁인 목사, 버클리연합감리교회 CA
올린날: 2013년 7월 8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