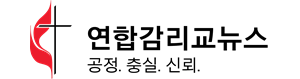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편집자 주: 이 글은 연합감리교뉴스의 <영화와 설교> 시리즈로, 영화 “컬러 퍼플”에 대한 현혜원 목사의 글입니다.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현혜원 목사가 시카고 제일 ”템플”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제공, 현혜원 목사.
현혜원 목사가 시카고 제일 ”템플”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 제공, 현혜원 목사. 먹여 살려야 하는 식구들이 있으니 ‘간신히’ 음식을 하셨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 여러모로 어머니의 음식은 있어야 하는 구성 요소들이 빠져 있거나, 없어야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니던 대학 근처 분식집에서 김치를 먹고, 김치가 이렇게 맛 있을 수 있는 거냐며 감탄했던 기억을 시작으로, 먹는 행위가 즐거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어머니의 음식을 먹고 자란 저는 음식에 ‘감칠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제가 하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음식맛을 따라가고는 합니다. 친구가 요리에 열정이 있고, 심지어 감칠맛까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걸 보면, 종종 친구의 어머님이 요리 솜씨가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 저의 빵점 요리 실력은 어머니가 주신, 어머니와 닮은 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난 15년 동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어머니가 해주신 청국장입니다. 정말 맛이 없었는데, 이상하지요. 미국에 유학 온 지 일 년 만에 가족이 그리워 14시간을 날아 도착한 날 아침 어머니는 청국장을 끓여 주셨습니다. 국물에 우려낸 멸치를 제대로 솎아내지 않아 거대한 멸치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여행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니 곁에 앉아, 쌀밥과 함께 든 그 청국장을 여태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그리운 것은 저를 기다리며 아침 일찍 밥을 지으신 어머니의 사랑이겠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진 앨리스 워커의 소설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의 씰리(Celie)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상냥한 사람입니다. 어린 씰리의 손을 이끌어 자신이 하고 있던 바느질 천과 바늘과 실타래를 만져보게 해 줍니다. “느껴봐, 하나하나 만져봐.”라고 딸에게 말해주고, 어머니의 자상한 시선 아래에서 바늘과 천을, 실타래를 만져보며 씰리는 어머니의 세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기억의 편린 속, 이 사랑이 많은 어머니는 그 후 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힘이 됩니다.
앨리스 워커의 수필집 <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를 보면 그녀가 컬러 퍼플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시인 장 투머는 20년대 초 남부를 여행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흑인 여성들의 영성이 너무 강렬하고 깊고 무의식적이어서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은 목표 없이 비틀거렸습니다. 학대받고, 훼손된 몸, 고통으로 인해 어둡고 혼란스러워 스스로 희망조차 가질 가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타적인 추상화 속에서 그들의 몸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여성은 "성적 대상"을 넘어 단순한 여성이 아닌 "성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일종의 사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다리를 우리는 계층(hierarchy)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그 계층의 가장 최고층에는 아마도 ‘돈 많고 좋은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남자’가 위치할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그 어느 것도 어려울 것이 없고, 거칠 것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다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돈 많고 좋은 학위를 가진 백인 여자’가 오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조건은 같지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백인 여성들은 비슷한 조건의 백인 남성보다 평균 약 20퍼센트 정도 적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경제 조건과 학위가 좋은 유색 인종 남성이, 그런 다음엔 유색 인종 여성이 오겠지요. 그런 다음에는 경제 조건도 좋지 않고 학위도 없는 백인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유색 남성과 여성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사다리의 최하층에는, 경제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유색 여성이 남게 됩니다.
컬러 퍼플은 1920년대, 미국 남부의 배우지 못한, 가진 것이 없는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 던지는 수많은 돌멩이를 온몸으로 무수히 맞아내며 그저 버티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층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삶을 향한 경탄과, 타인을 향한 애정, 회복과 끈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씰리는 자신이 겪는 삶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버텨냅니다. 영화에서 그녀의 동생 네티(Nettie)는 자신을 범하려던 씰리의 남편 미스터를 발로 차고 도망갑니다. 분노한 미스터는 네티를 자신의 집에서 쫓아냅니다. 쫓겨나는 네티는 “왜(why)?”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미스터를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그녀의 울부짖음은 영화를 보는 사람의 심장마저 삼켜버릴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씰리는 ‘왜’라는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때리면 맞으며, 학대하면 그저 당하며 버텨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녀는 사랑을 잃지 않고, 그 사랑으로 자기 삶에 젖어 든 다른 이들의 삶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바느질로 그녀는 이후 자신의 옷 가게를 엽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합니다.
저는 “베 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홍정수 박사님이 펴낸 책의 제목인데요, 마치 창세기의 하나님처럼,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서늘한 저녁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처럼,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올라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사다리에서 아마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은, ‘경제력이 없고, 배우지 못한 여성’ 일 겁니다. 지금은 ‘경제력이 없고, 배우지 못한 이주 여성’ 일 수도 있겠네요. 그 경제력 없고 배우지 못한 여성이 베틀에 앉아서, 가족을 위해, 마을의 다른 이들을 위해 베를 짭니다.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연합감리교뉴스에서 제공하는 주간 e-뉴스레터인 <두루알리미>를 받아보시려면, 지금 신청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베를 짜는 여성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경탄과 애정과 회복의 하나님이, 가엾고 순수한 이들을 돌보십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과 ,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곱 남매 중 막내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부농이셨다는 할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태어날 즈음에는 많던 땅을 다 잃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기초 교육 외에는 배우지 못한 채 집에서 농사를 도우며 자랐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의 막내딸은 귀엽지만, 공부를 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사회의 계층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까요?
컬러 퍼플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꾼 정원은 어쩌면 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싫어하는 요리를 ‘간신히’ 하게 만든 저라는 존재가, 그녀의 존재가 여태껏 이 세상에 의미 있게 하는 정원일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짜주신 베옷을 입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짜주신 베옷을 입고,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둘러주신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사랑과 경탄, 의지와 회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씰리의 어머니는 사실 씰리를 저주하며 죽었습니다. 자신과 재혼한 남편이 씰리를 성폭행했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그녀는 씰리가 남편을 유혹했다고 굳게 믿었지요. 그러나 씰리는 마음이 아팠던 그 어머니가 아닌, 더 어릴 적, 실타래를 손에 쥐여주며 사랑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며 웃음 짓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씰리는 손에 실타래를 쥐여주던 어머니의 웃음, 저는 거대한 멸치가 여전히 들어가고, 맛이 없던 청국장을 먹던 시간입니다. 어느 기억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지요?
연합감리교뉴스에 연락 또는 문의를 원하시면, 김응선 목사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615-742-510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감리교뉴스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면, 무료 주간 전자신문 두루알리미를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