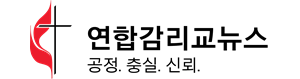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몇 자 긁적여 본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 주를 눈물과 기도로... 머나먼 이국 땅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저 뉴스 화면만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었다. “제발...”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해 본다, 구조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174… 하지만 화면 속의 이 숫자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가만이 있다. 며칠 동안 자다 깰 때마다 다시 확인해 보는 그 숫자는 야속하게 변할 줄 모른다. “하나님...” 모두들 알고 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는 게 이렇게 저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이 참담한 일을 앞에 두고 언론들이 하는 (하려는) 짓들이 보이니 더욱 맘이 답답해진다. 하기야 뉴스가 “뉴스 쇼”가 된지도 오래 되었으니 뭐라 딱히 할 말은 없다. 안볼 수도 없고... 기운이 빠진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리저리 치이는 건 우리 불쌍한 아이들과 가족들이구나, “미안하다, 아이들아,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어젯밤, 토요일 저녁, 부활주일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 정말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어찌 쉬우랴... 하지만 기도해 본다, 설교단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세상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쇼가 되지 않기를...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사람들과 함께 우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참 부활의 의미가 선포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어디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이 났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의 사이인 토요일, 어떤 특별한 이름도 주어지지 않은 그 토요일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 오늘따라 더더욱 실감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그리고 참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꽉 붙잡아 본다.